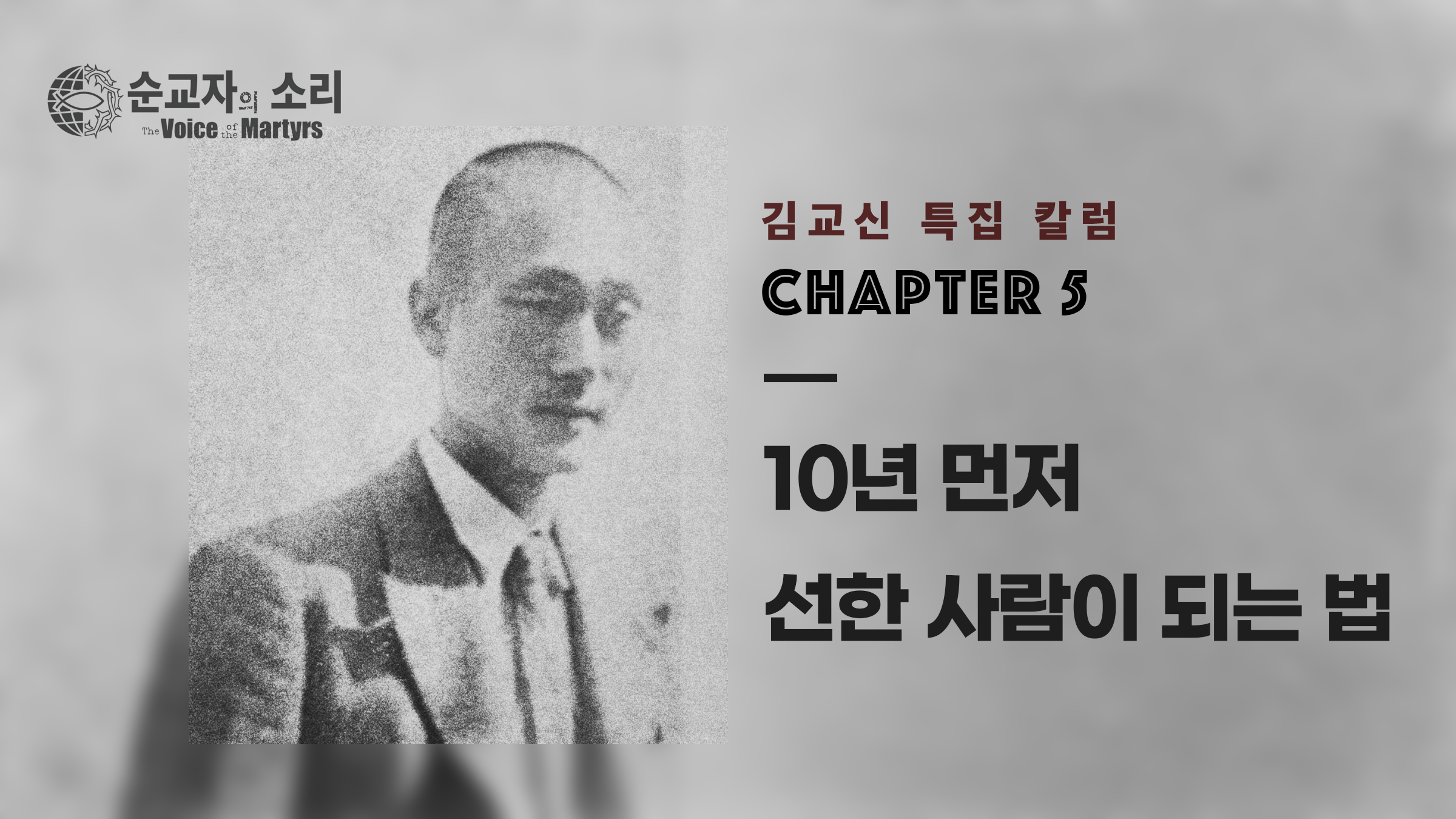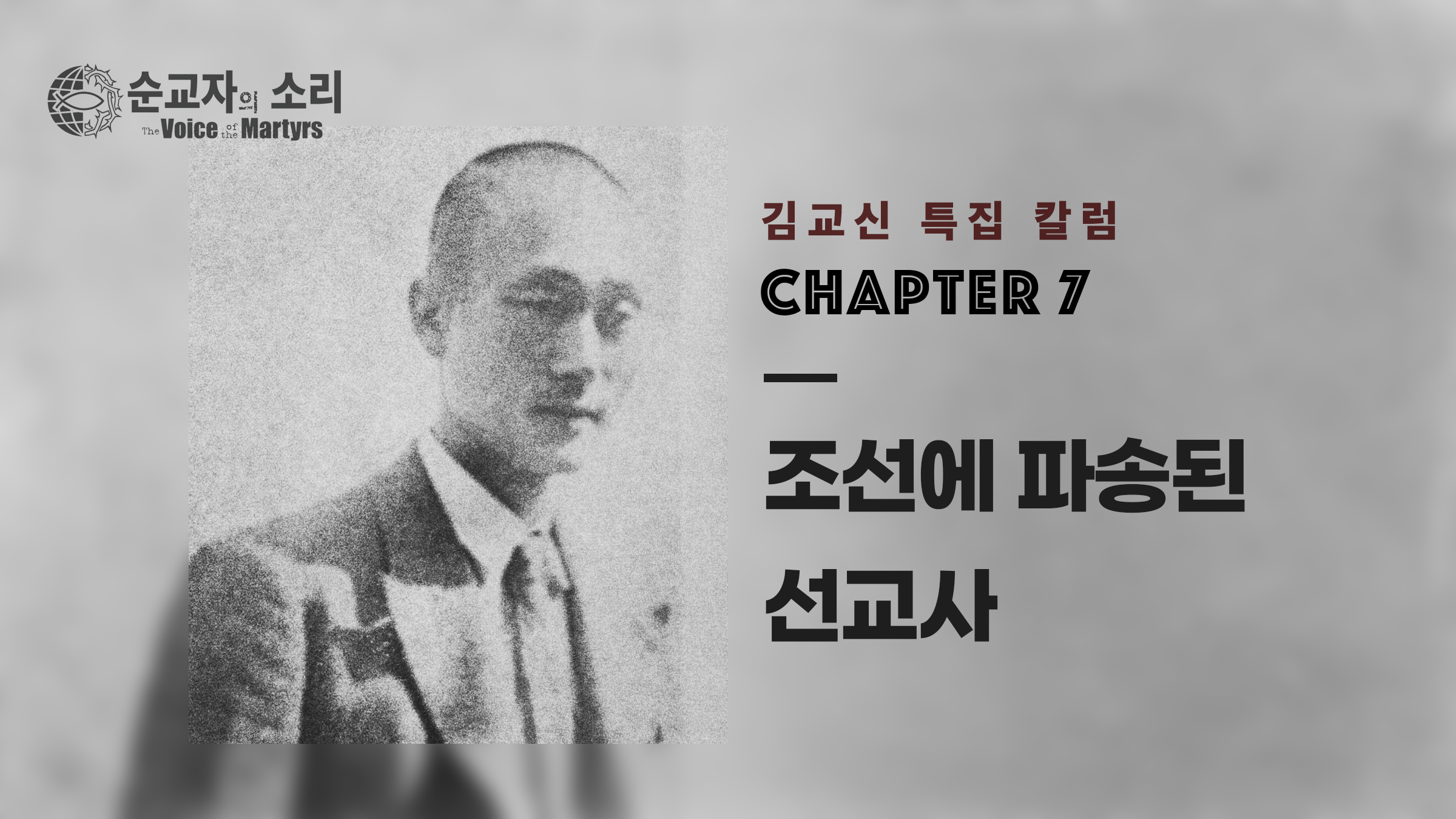【김교신 특집】 제6부. 김교신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과 죽음
새벽에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상징이라면, 홀로 일찍 일어나 찬물로 자신의 몸을 씻고 늦게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김교신에게 기독교의 상징이었다.
후에 월간 《성서조선》에 실린 158편을 모두 모아 총 7권의 김교신 전집 형태로 재발간한 노평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김교신]은 다른 조선인들이 독특한 방법으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성서조선》을 발간했다. 즉, 그는 기성 교회의 의식이나 설교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조선인의 혼을 담아 성경을 공부함으로 기독교를 소화하기를 원했다. 그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표현될 수 있는 열정을 찬물로 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2012, 180).
성경 공부를 통해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은 사실 김교신이 처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는 서양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조선 기독교의 특징이 된 토착적 실천 방법이었다.
한국의 기독교는 외국 선교사들이 아닌 한국의 유교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유교식 전통은 유생들이 고전을 읽고, 읽은 것을 토론하며, 연구하는 것이다. 고전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과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해준다.
역사적으로 보면 17세기 부터19세기까지 조선에 로마 카톨릭교가 형성되었고 유교적인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수동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직접 성경을 직접 연구하고 이해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의 도입 초기에도 유교의 영향을 받은 [무교회주의] 신자들은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성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고, 외부의 도움 없이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알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했다(황, 2012, 175).
김교신에게 있어 기독교는 지켜야하는 율법과 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그는 유교 서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기독교를 가르쳤다. 단, “유교 원문을 읽고, 암송하고, 해석하는”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해석하도록 가르쳤다(황, 2012, 28).
여러 면에서, 김교신은 자신이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다른 과목들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쳤다(김, 2012, 2). 그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범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보다 공립학교 교실이 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이 목회를 하는 것보다 덜 헌신적으로 보이고, 일부 민족주의자들보다 덜 혁명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교실 안에서 조선과 그리스도를 향한 김교신의 충실하고 솔직한 행동 때문에 그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간주했다.
예를 들면, 김교신은 조선 이름을 계속 사용했고, 출석부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조선 이름을 사용했다. 수업도 조선말로 했고 식민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리 수업 시간에는 일본이 아닌 조선의 지리에 대해 가르쳤다. 아침 조회 때에 일본 천황에서 절하는 것도 거부했다.
그는 또한 조선어 성경으로 수업했다. 그는 결국 12년의 교사 생활을 끝으로 1940년 사임 당했다(김, 2012, 2). 2년 후 그는 자신의 월간지에 실린 한 편의 기사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 투옥되어 1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300명의 구독자들은 경찰에 의해 열흘 이상 구금되었다(황, 2012, 100).
감옥에서 풀려난 뒤 가르치는 일이 금지되었으나, 그는 이번에는 흥남 질소비료주식회사에서 가르치기를 계속했다. 일본 대학 동창 중 한 명이 그를 그 공장에 있는 5,000명의 조선인 노동자를 감독하고 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고용하였다.
노동자들의 육체적 필요를 돌보는 일 외에도 김교신은 노동자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쳤다. 일본 정부가 반대하였으나, 김교신의 동창과 공장장이 그를 옹호했고 그 수업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산성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2012, 168).
결국, 믿음대로 삶을 산 김교신은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종전 3개월 전인 1945년 4월, 김교신은 감염된 노동자들을 직접 돌보다 장티푸스에 걸렸다. 그는 44세의 나이에 숨졌고, 적당한 헌사가 드려지기도 전, 시신은 화장되었다(황, 2012, 89). 그도 아마 그것을 원했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