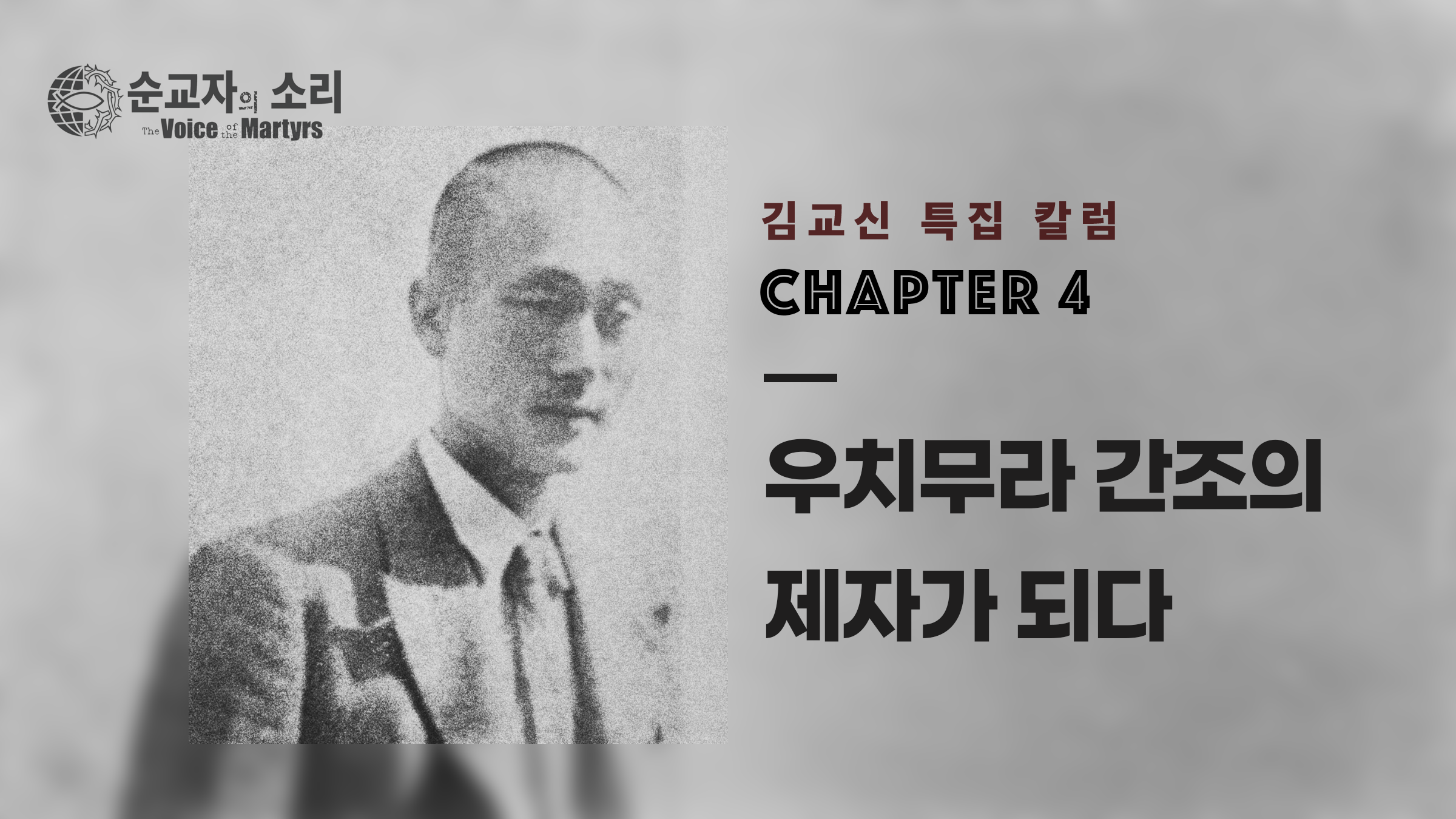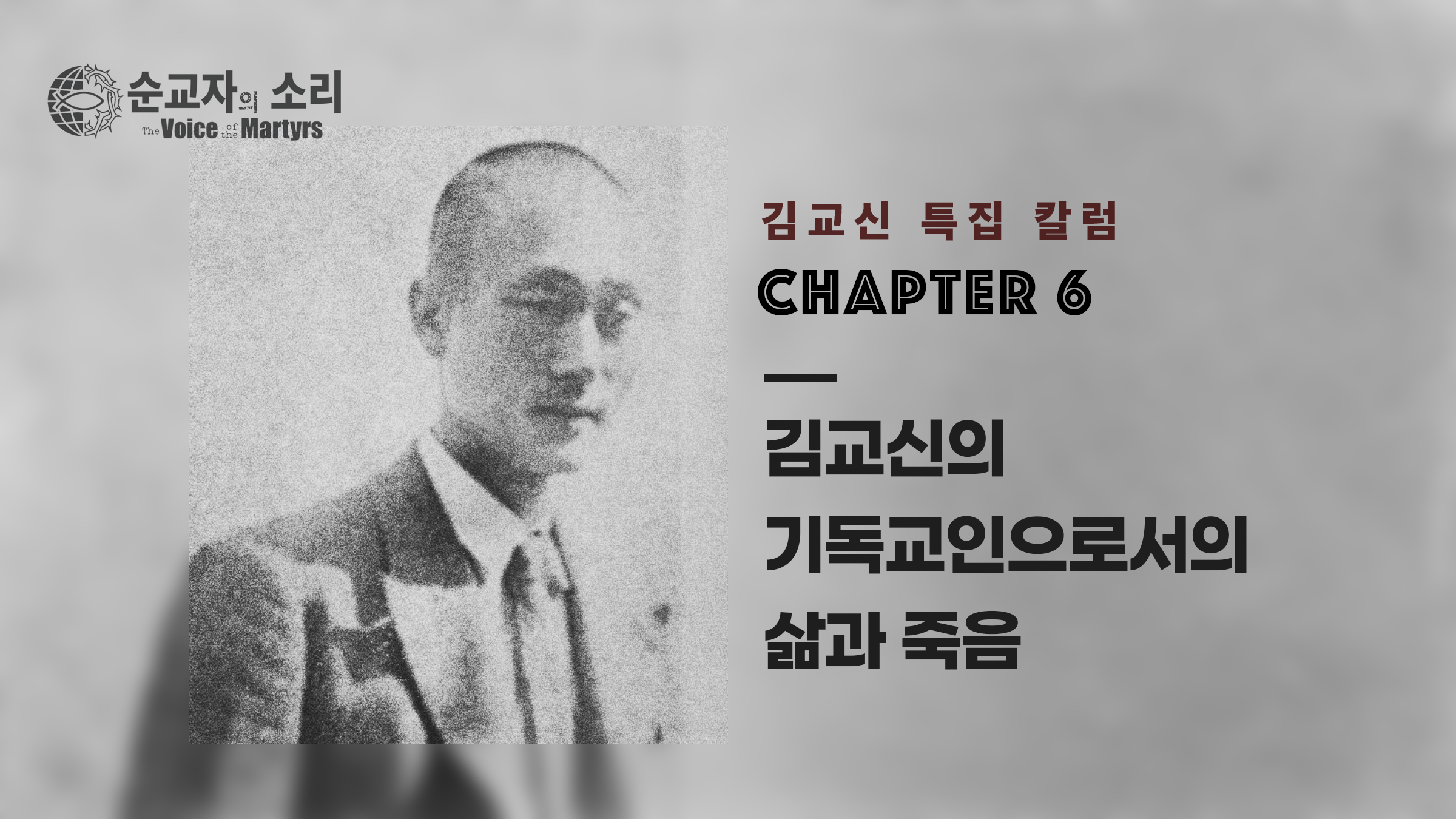【김교신 특집】 제5부. 10년 먼저 선한 사람이 되는 법
김교신의 삶과 교회의 경험은 우치무라 간조와 유사한 점이 많다. 우치무라 간조가 조국을 떠났었던 것처럼, 김교신 또한, 1918년 19세의 나이로 한국을 떠나 8년을 해외에서 보낸 후 1927년 귀국했다(황, 2012, 81). 우치무라 간조와 마찬가지로 김교신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의 핵심적 목표로 삼은 채, 강한 유교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되는 자신의 도덕적 결함 때문에 좌절했다. (황, 2012, 81).
김교신은 일본 체류 중이던 1820년, 도쿄에 있던 선교사로부터 산상수훈이라는 복음을 들었고, 그 선교사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을 받았다. 매일 그 책을 읽으며 김교신은 그의 삶을 변화시킨 이 새로운 통찰력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다. 유교에서 배운 것과 달리, 인간은 본디 선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덕적 노력으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유교와 달리, 기독교적 복음은 믿는 자가 변화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강조했다.
따라서 김교신은 선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 선을 성취하는 길을 찾았다. (황, 2012, 83). 그는 기독교인이 되면 10년 더 빨리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유교보다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김, 2012, 167). 김교신은 일본의 한 지역 교회에 나갔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도덕적 성장을 하던 신앙 초기 기간이 지난 후, 사소한 파벌 싸움으로 다투던 교인들 의해 목사가 교회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것을 보고 크게 상심했다(황, 2012, 84). 그는 선한 사람이 되려는 의지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경험한 것은 “추함, 불의, 음모, 그리고 거짓”이었다(황, 2012, 85).
그는 교회에 환멸을 느꼈지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마침내 1920년, 그는 우치무라 간조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가 들은 우치무라 간조의 첫번째 강의이었고, 그 후 7년동안 참석하여 강의를 성실히 들었다(황, 2012, 85).
김교신이 기독교를 접하게 된 과정이 다른 조선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것은 중요하다. 많은 조선인은 미국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보았고, 그 이유가 기독교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교신은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 때문에 기독교에 이끌렸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다. 유교는 할 수 없었다고 믿었던 그 일, 즉 기독교만이 자신뿐 아니라 조국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황, 2012, 84).
이와 같이 김교신은 미국식 기독교가 아니라 상산수훈을 통해서 개인과 조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미국식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러한 변화를 위해 미국 문화와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치무라 간조로부터 배웠다. 우치무라 간조는 1886년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의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틀림없이 있다는 생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 하나님은 20세기에 걸친 단련으로 얻어진 일본의 국가적 특징이 미국과 유럽의 관념들로 완전히 대체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기독교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각 나라에 주신 모든 특질을 기독교가 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복되고도 힘이 되는 깨달음은 바로 일본(J)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다(웰즈, 2001, 157).
김교신에게는, 조선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방정식에 미국 문화를 끼워 넣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선이 결코 온전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였다(웰즈, 2001, 159).
그는 개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도 혼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개인을 개종시키는 것뿐 아니라 민족의 혼을 개종시키는 것도 그의 부르심이라고 믿었다(웰즈, 2001, 159).
따라서 김교신이 조선 교회와 그 관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대신 그는 조선이 성경을 품고, 성경에 담긴 메시지를 조선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드러나는 참된 민족의 혼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는 조선으로 돌아왔고, 우치무라 간조가 일본에서 한 일을 조선에서 수행하기 시작했다. 잡지, 성경 공부, 그리고 우치무라 간조처럼 유교적으로 접근해서 기독교를 배우는 것이 조선의 문화에 더 적합하다고 믿었다(황, 2012, 64).
1933년 그는 산상수훈에 관한 책을 펴냈고, 그 책을 통해 기독교는 성도로 하여금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피력했다(김, 2012, 167).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적 진리를 사용하여 “영원한, 불멸의 조선”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었다(웰즈, 2001, 160).
김교신은 교회가 아닌 성경이 “기독교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근간”이라고 믿었다. 그는 조선인들이 교회 대신 무교회주의 운동에 가담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늘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도록 도와주었다. 즉, 교회와 다양한 교파는 김교신에게 있어서 그저 거짓의 극치였다(웰즈, 2001, 159).
그는 세속적 민족주의와 시민운동도 거짓의 극치로 보았다. “참된” 기독교 사명은 “성서를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개인 및 국가의 삶을 확립”하는 것이었다(웰즈, 2001, 165).
이러한 목표를 마음에 두고 김교신은 조선인에게 본질적으로 불화를 일으키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들, 즉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소들인 의식주의(ritualism), 제도존중주의(institutionalism), 성직자 중심주의(clericalism)를 거부하라고 권고했다(황, 2012, 27). 그는 성령을 통해 도덕적인 완전함을 이루려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주었다.